[산경e뉴스] 전고체 전지(All Solid State Battery. ASSB) 관련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중인 일본의 도요타는 오는 2027~2028년에 이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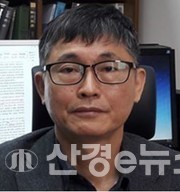
10분 충전에 1000km를 주행할 수가 있다니 꿈의 배터리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SSB에는 덴드라이트가 생성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과장된 찬사도 있다.
그런데 도요타의 목표는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차라고 하며 그 이유로서 생산 단가를 들고 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항간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도요타는 5년 전인 2020년 동경 올림픽에서 ASSB를 탑재한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기화로 취소한 일이 있다.
짧지 않은 사이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삼성SDI는 BMW 및 미국의 '솔리드 파워(Solid Power)'와 함께 2027년 양산을 목표로 ASSB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대로 잘되기 바란다.
이 외에도 파이롯트 규모의 ASSB의 시제품을 내놓았다는 회사는 많다.
미국의 퀀텀스케이프(Quantumscape)에서 중국의 고션(Gotion)까지 여러 회사들이 이 단계에 있다고 하나 이는 곧 상용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와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해서 독일의 벤츠가 잠재적 경쟁자가 될수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변변한 배터리 기업이 하나도 없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를 왜 주목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벤츠 계열사의 '공압 엑츄에이터(actuator)' 특허 기술 때문이다.
이는 곧 ASSB 상용화가 겪고 있는 난제의 핵심을 대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바, 이를 가로 막는 결정적 이유는 충방전에 따른 전극-전해질 접촉의 상실이다.
전극 사이 사이를 스며들 수 있는 액체 전해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해질이 고체인 경우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음극 물질로서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ASSB는 충방전시에 큰 부피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리튬 금속의 성긴 결정 구조로 인해 방전시에는 부피가 줄어 들고 충전시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 난다.
만약에 방전시에 가압을 하지 않는다면 음극-전해질 사이에 ‘빈 공간’이 크게 생겨 성능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
배터리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압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50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ASSB의 상용화에 부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의 해소와 관계되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2025년 9월 ‘네이쳐’ 자매지인 '네이쳐 지속가능성(Nature Systainability)'에 발표되었다.
파이롯트 규모에 도달했다는 여러 회사의 홍보와는 달리, 이런 중요한 연구 결과는 ASSB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
이 연구는 같은 잡지의 10월 7일자 호의 ‘New & Views’ 란에서 편집인이 ASSB를 위한 ‘실용적(practical)’ 방법이 될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쉽게 말해, 높은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ASSB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모두 '중국과학원(Chines Academy of Science)'을 비롯한 중국 학계의 학자들이다.
이토록 중요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초기에 음극-전해질 사이에 '요오드화 리튬(LiI)'과 같은 리튬염을 끼우는 것이다.
고체 전해질로는 리튬 양이온(Li+)의 이동도가 좋은 황화물계 물질을 쓴다.
방전시에는 Li+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극적인 점은, 요오드 음이온(I-)도 함께 이동한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음극-전해질 사이의 요오드화 리튬(LiI)이 양극-전해질 사이로 이동함으로써 방전시 부피 변화를 최소화한다.
저자들은 요오드화 리튬(LiI)'을 '동적 적응성 계면(Dynamic Adaptive Interface. DAI)'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 요오드화 리튬(LiI) 염은 음극 표면의 빈 공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덴드라이트 형성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별히, 양극 물질로서 산화 티탄계 물질을 사용하면 8분 이내에 완전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급속 충방전하면 가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2400회 후에 전하용량을 91%까지 유지한다고 한다.
단점을 들자면 양극 물질의 특성성 높은 전압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NCM 계열의 양극 물질에 대해서도 적용중이라고 한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지 궁금하다.
그 사이에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면 논문 대신에 국제 특허를 먼저 출원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리튬기반 ASSB의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의 CATL이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소듐이온전지(Sodium Ion Battery. SIB)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갖는 소듐 기반의 ASSB 시장도 선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리튬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소듐을 채택하는 소듐 SSSB는 휴머노이드의 대량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또 있을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룬 기술이 ASSB의 미래를 모두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추후 다른 ASSB 기술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필자는 '전문가 기고'란을 통해서 ASSB 보다는 반고체전지(Semi Solid State Battery: SSSB)가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쉽게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CATL'과 'WeLion'등은 SSSB를 시험중에 있다.
사실이라면, SSSB와 ASSB는 보완적 관계로 거의 동시에 상용화 될 수 있다.


![[전문가 기고] 중국 소듐이온 배터리 상용화 초읽기…LFP 대체 신호탄](https://cdn.skenews.kr/news/photo/202510/50324_40354_5258.jpg)
![[전문가 기고] 미 트럼프의 중국 반도체 압박정책이 외려 중국의 기술자립 앞당겨...AI 하드웨이 독자적 생태계 구축](https://cdn.skenews.kr/news/photo/202509/50090_40087_63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