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수소는 매우 가볍고 확산력이 강해 지하에 자연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오랫 동안 못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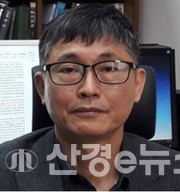
그런데 2012년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300kW급 발전에 이용된 이래 2019년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도 수소 시추에 성공했다.
2023년 Science 잡지에 의하면 수소는 지하 깊은 곳에서 고온의 물과 철을 포함하는 암석의 화학 반응에 의해 끊임없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지하 깊은 물이 방사성 원소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생기도 한다.
수십억년 동안의 지각 운동에도 불구하고 안정하게 보존된 지각인 Craton 아래에서 생성되고 두꺼운 지층에 같히거나 얇은 지층으로 이동하여 지표로 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미국, 중국, 서알프스, 브라질 등에서 자연수소가 확인됐는데 2022년 미국 지리학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수천년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수 있는 매우 많은 양이라고 한다.
현재 수전해를 이용한 녹색 수소 생산 비용은 킬로그램(kg) 당 5~10달러인데 반해 말리의 자연수소 비용은 0.5달러로써 이런 에너지원을 이용할수 있다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EU는 2030년까지 2000만 톤의 자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미국은 2019년 수소 광산에 시추를 한후 2022년 9월 7억 달러를 자연수소 생산에 투입하기로 했다.
2023년 프랑스 회사는 로렌 지역에 4600만톤의 수소가 저장되었다고 추측했다.
자연수소를 대규모로 추출하는 일은 석유를 채굴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이는 수소가 지하 깊은 곳의 고온, 고압 하에서는 고체내에도 침투하기 쉽고 반응성도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저장, 운송, 사용 중에 누출되기 쉽고 이로 인한 간접적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11.6배에 해당하는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누출은 산업적 규모의 채광 과정에서는 폭발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도 야기할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Nature Communications 잡지에 발표된 리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수소는 철을 다량 포함하는 상부 맨틀의 암석(ultramafic rock)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수소는 지하 깊은 곳부터 시추관 케이스인 강철에 흡수되고 원자의 형태로 케이스 내부로 확산되며 여러 종류의 결점을 유발하여 강철을 부서지기 쉽게 한다.

또한, 지하 미생물인 SRB (sulfate reduction bacteria)가 황이 풍부한 물질에 환원 반응을 유발시켜 황화수소를 생성하며 이차적으로 시멘트나 케이스의 손상을 심화시킨다.
수소는 시추관 어디에나 기공을 만들어 다른 기체가 누출되기 쉽게 한다.
수소나 황화수소와의 화학반응으로 강한 탄성을 갖는 고무 실란트가 손상되면 여기서도 누출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시멘트와 시추관의 연결 부위가 고리 모양으로 손상되고 여기에 수소 기체와 물등의 액체가 계속 축적됐다가 급작스레 밖으로 분출하고 폭발에 이르는 일이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들의 배경을 이루는 물리화학적 과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소와 시멘트의 반응에 대한 실험은 최장 168일까지 수행됐는데 이는 자연수소 광산의 수명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시추관 금속 표면에 코팅을 하거나 수소에 내성이 있는 고분자 등을 시멘트에 첨가하여 자연수소를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0일 시행되기 시작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국가는 전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수전해, 수소발전,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는 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2025년 3월 11일 한국재생에너지 산업발전 협의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후 입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값비싼 촉매와 순도 높은 물을 필요로 하는 수전해를 이용하여 녹색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일은 아직도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국이 안정되면 과거 자원외교의 실패를 거울로 삼되 세계 자연 수소 광산의 채광이 국내 녹색수소 생산의 대안 또는 보완책이 될수 있는 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기고] '산업계 비타민'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 어떤 방식으로 미국 트럼프 전략 산업을 겨냥할까?](https://cdn.skenews.kr/news/photo/202504/39919_30368_1515.jpg)
![[전문가 기고] 전세계 수소 수요 잠재적 선두주자인 독일-중국 제철업의 전략...세계 수소경제 포스코 전략이 궁금해지는 이유](https://cdn.skenews.kr/news/photo/202506/40210_30685_1924.jpg)
